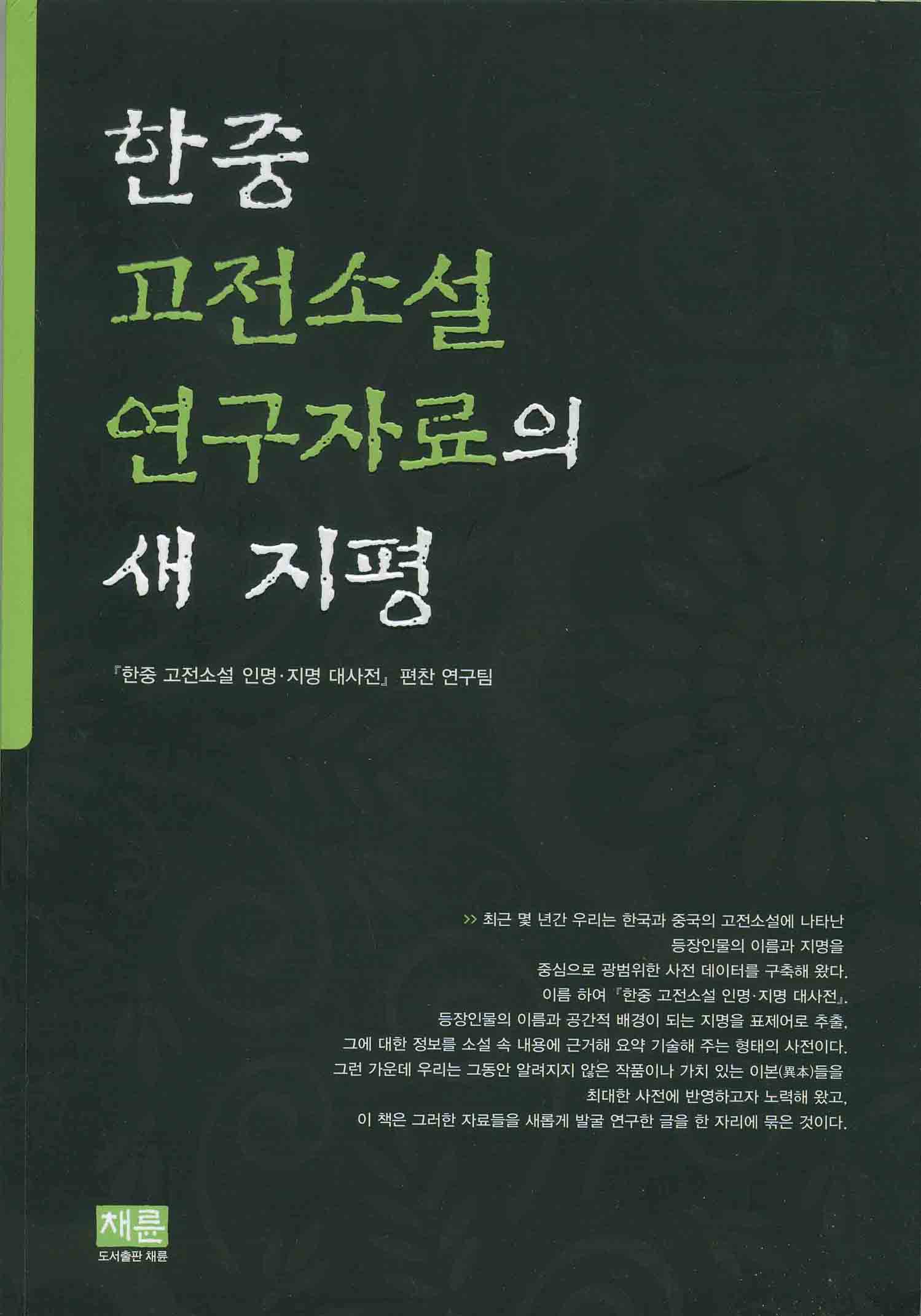
도서명: 한중 고전소설 연구자료의 새지평
지은이: 『한중 고전소설 인명․지명 대사전』편찬 연구팀
분야: 고전문학
발행일: 2008년 12월 30일
ISBN 978-89-960140-5-8 93800
신국판(152mm×223mm), 반양장, 371면, 21,000원
![]()
이 책은 자료적 가치가 높은 고전소설 작품이나 이본을 새롭게 발굴 연구한 글이다. 총 3부로 , 제1부에는 <문성기>․<정와기몽>․<유장옥전> 등 새롭게 발굴 소개한 몇몇 한국소설에 대한 작품론 성격의 글을 수록하였고, 2부에는 화몽집․<토공전>․<강로전> 등 자료적 가치가 지대한 한국소설 이본을 새롭게 발굴 소개한 글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3부에는 중국소설로서 조선의 실상이 핍진하게 그려진 <진해춘추>를 새롭게 발굴 연구한 논문을 비롯해, 한국에서 성립된 <삼국지연의> 계열의 <공명선생실기>, 중국소설을 한글로 번역한 <요화전>, 중국의 현대 지식인소설인 한샤오꿍(韓少功)의 <마교사전(馬橋詞典)> 등을 새롭게 발굴 또는 고찰한 글을 수록하였다.
![]()
조선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소설이 유행했을까?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은 여사서(女四書 서(序)에서, “근래 부녀자들이 다투어 능사로 삼는 일은 오직 패설(稗說)을 숭상하는 것뿐으로, 날이 갈수록 더 많아져 천 종이 훨씬 넘는다.”고 했다. 18세기 중반의 소설사적 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채제공은 또한, 이미 당시에 상인들이 소설책을 정사(淨寫)해 돈을 받고 독자들에게 빌려주는 이른바 세책업(貰冊業)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행하기도 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부녀자들이 비녀나 팔찌를 팔거나 빚을 내어서라도 다투어 소설책을 빌려가 온종일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영상서사물이 없던 조선시대에는 소설이 가장 유력한 오락서사물이었다.
1960년대 말, 창덕궁 낙선재(樂善齋)에 소장된 이른바 궁중본 소설책이 무더기로 발견된 이래, 지난 20여 년간 그것들은 고전소설 전공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끄는 목록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국문학계의 기초연구자료적 지반이 두터워지고, 연구역량을 튼실히 다지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것은 과연 국문학계는 물론 우리 문화를 살찌우는 좋은 ‘먹잇감’이 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금, 국문학 연구자들은 항상 새로운 자료에 목말라 한다. 현재 전해지는 600여 종의 고전소설이 수적으로 부족하거나 연구가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학문적 열망은 연구자 누구나 본능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자 누구에게나 새로운 자료에 대한 발굴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책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이 때, 최근 나온 한중 고전소설 연구자료의 새 지평(채륜)이라는 연구서가 주목을 끈다. 이 책은 <문성기> <정와기몽> <진해춘추> 등 고전소설 연구자들에게도 낯선 소설자료를 새롭게 발굴 소개한 연구결과를 한 자리에 모아 엮은 책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의 한중 고전소설 인명․지명 대사전 편찬 연구팀(연구책임자 양승민)에서 펴낸 책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제1부에는 <문성기>·<정와기몽>·<유장옥전> 등 새롭게 발굴 소개한 몇몇 한국소설에 대한 작품론 성격의 글을 수록하였고, 2부에는 화몽집·<토공전>·<강로전> 등 자료적 가치가 지대한 한국소설 이본을 새롭게 발굴 소개한 글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3부에는 중국소설로서 조선의 실상이 핍진하게 그려진 <진해춘추>를 새롭게 발굴 연구한 논문을 비롯해, 한국에서 성립된 <삼국지연의> 계열의 <공명선생실기>, 조선시대 한글번역본 중국소설 <요화전> 등을 새롭게 발굴 고찰한 글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고전소설의 자료적 지평 확대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한국고전소설 연구의 지평 확대를 위한 중국고전소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느끼게 된다.
![]()
지은이 『한중 고전소설 인명․지명 대사전』 편찬 연구팀
구문규 우송대학교 초빙교수
김정녀 단국대학교 강의교수
소인호 청주대학교 교수
양승민 선문대학교 연구교수
이은봉 인천대학교 강사
장경남 숭실대학교 교수
최길용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
머리말 5
1부 신 발굴 작품의 위상과 성격
새 계모형 고소설 <문성기> 연구
1. 머리말
2. <문성기>의 이본 고찰
3. <문성기>의 경개(景槪)
4. <문성기>의 서사적 특성과 의미
5. 맺음말
신 자료 <靜窩記夢>의 작자와 우의적 성격
1. 머리말
2. 작자의 생애와 遺稿
3. 몽중 인물 ‘老先生’의 정체와 ‘退溪’
4. 學脈의 재구성을 통한 학문적 기반 강화
5. 맺음말
<유장옥전> 연구
1. 머리말
2. <유장옥전>의 書誌
3. <유장옥전>의 경개
4. <유장옥전>의 구성적 특성
5. <유장옥전>의 서사구조와 주제의식
6. <유장옥전>의 소설사적 의미
7. 맺음말
2부 신 발굴 이본의 자료적 가치
17세기 고전소설의 저작 유통과 화몽집의 소설사적 위상
1. 서론
2. 『화몽집』 수록 작품의 이본적 성격
3. 17세기 소설의 저작 유통과 화몽집
4. 결론
신 자료 한문본 <兎公傳>의 성립 시기와 이본적 특성
1. 머리말
2. 서지사항
3. 이본 대비를 통한 先本 확정
4. 신 자료 한문본 <토공전>의 특징적 면모
5. 신 자료 한문본 <토공전>의 위상-맺음말을 겸하여
<姜虜傳> 이본 연구
1. 머리말
2. <강로전> 이본의 대비 고찰
3. <강로전> 이본의 계열적 성격과 선본
4. 맺음말
3부 중국소설 연구의 새 지평
중국 禁書小說 속의 명청교체기 朝鮮
-<鎭海春秋>에 형상화된 허구적 진실-
1. 서론
2. 주요 서사 구성과 그 서술 방식
3. <鎭海春秋>를 통해 본 명청교체기 동북아 정세와 朝鮮
4. 맺음말
완판 <공명선생실기>의 소설사적 의미
1. 머리말
2. 史料와 <三國志演義>에 삽입된 제갈량의 부인
3. 완판 <공명선생실기>의 소설사적 의미
4. 맺음말
한글필사본 <瑤華傳>의 번역 및 변이 양상
1. 서언
2. 중문본 및 한글번역본 <요화전>의 서지적 검토
3. 한글번역본의 번역 양상
4. 낙선재본의 변이양상
5. 결언
韓少功의 <馬橋詞典> 연구
1. 언어, 문화심리, 그리고 심근
2. 언어 심근에서 문화 심근까지
3. 문화심리 키워드로서의 <馬橋詞典>
4. 맺는 말
찾아보기
 철학은 슬기 맑힘이다_사이의 사무침 01
철학은 슬기 맑힘이다_사이의 사무침 01
 세계 과학소설사
세계 과학소설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