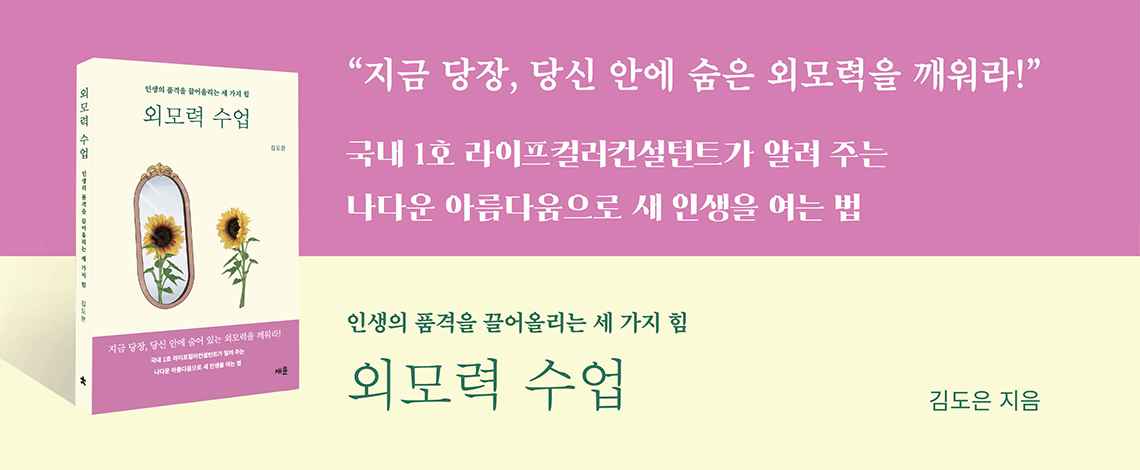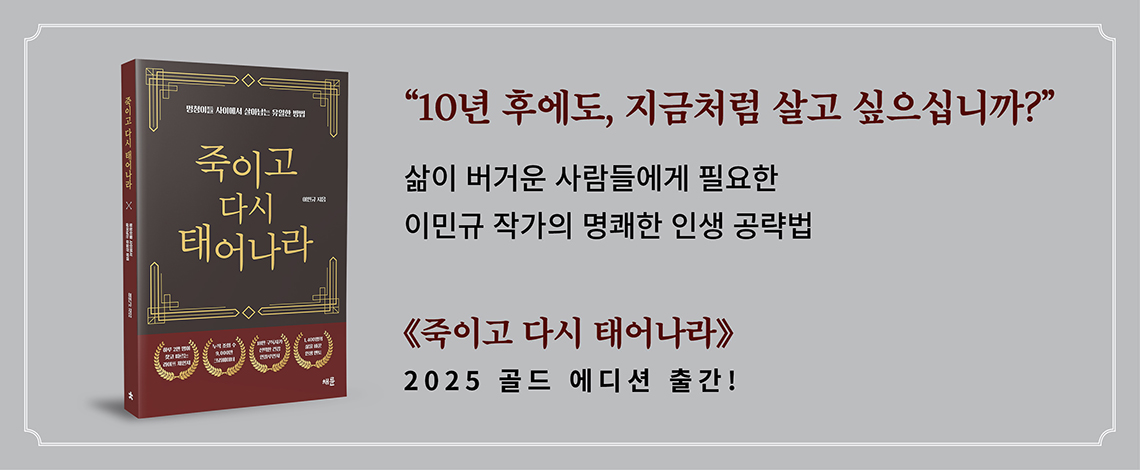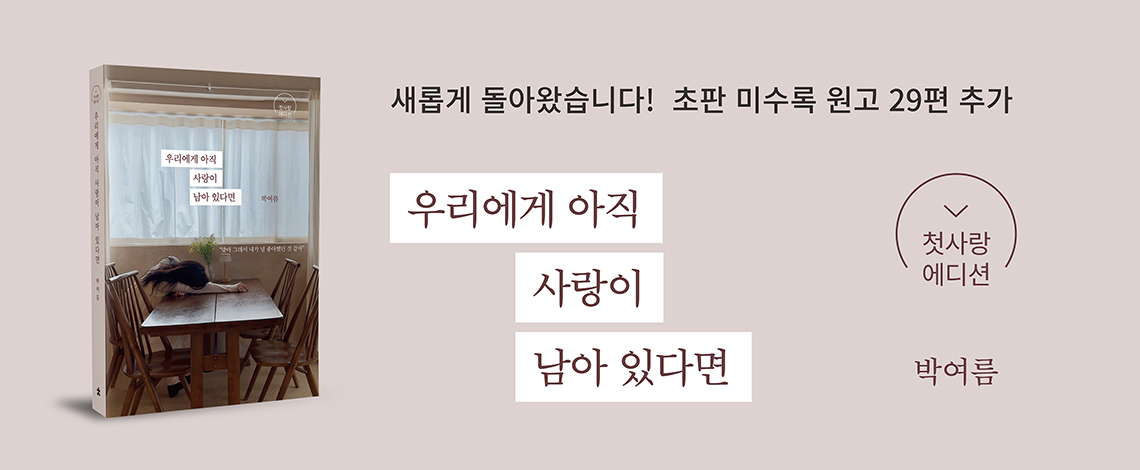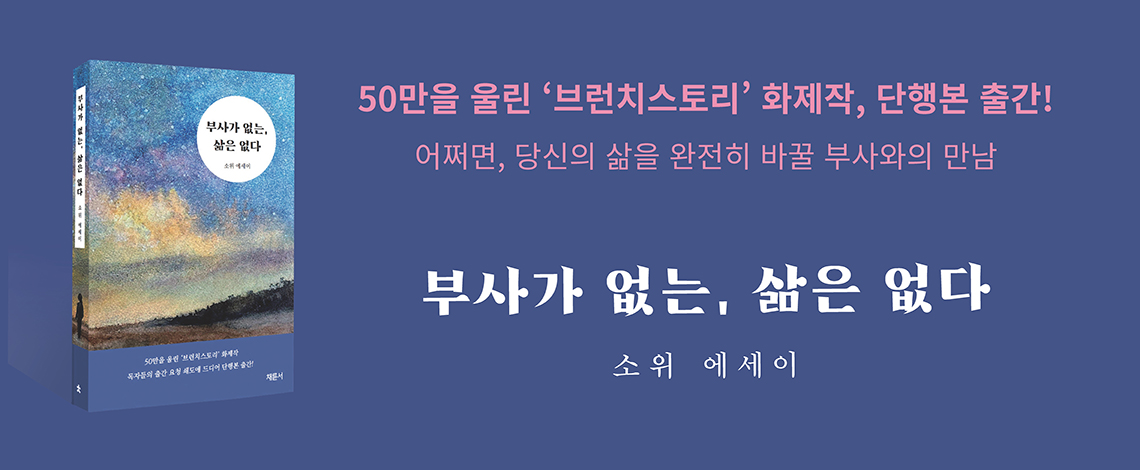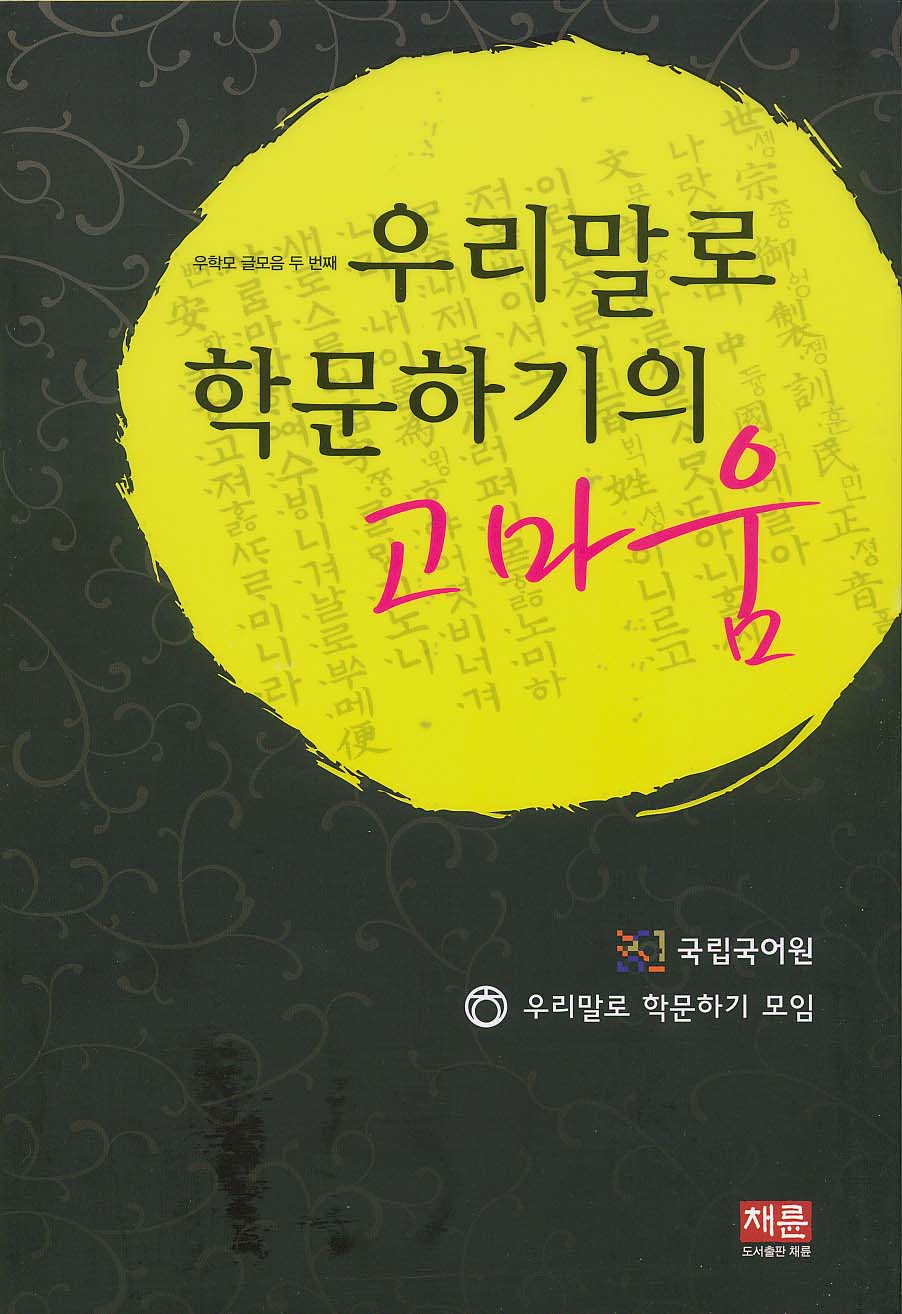
우리말로 학문하기의 고마움
지은이: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분야:인문학, 언어학
발행일:2009년 2월 28일
ISBN 978-89-960140-7-2 93800
신국판(152mm×223mm), 반양장, 432면, 19,800원
![]()
우리말로 학문하기의 고마움(채륜, 2009)은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2001년 10월 27일 창립)이 해마다 벌이는 말나눔 잔치에서 발표된 글들을 문집 형태로 묶어 낸 것이다. 지난 해(2008)에는 우리말로 학문하기의 사무침을 출판했다. 현재 우학모 회장을 맡고 있는 정현기(세종대 초빙교수, 전 연세대 교수) 교수는 책의 머리말에서 이 책이 출간되는 의의를 문화 지키기이자 자기를 찾아나서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책을 펼치면 여러 외침들이 빼곡히 들려온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정책을 세종 때 집현전 부제학을 지낸 최만리의 상소문에 빗대어 꾸짖는 건의서가 눈에 띈다. 그리고 박영식 전 교육부 장관이자 현재 학술원 부회장이 쓴 두 편의 글도 참으로 신선하고 솔직하다. 대한민국이 개항과 더불어 미국식 교육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 아픈 현실과 영어로 학문하는 것의 고달픔과 어려움 그리고 우리말로 학문했었더라면 뭔가 창조적인 이론을 수립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 등이 허심탄회하게 펼쳐져 있다. 그리고 임재해 안동대 교수와 양권석 성공회대 총장의 글도 눈여겨볼만하다. 이 둘은 모국어 운동이 학문과 문화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쳐 왔다는 것을 민속학과 성서해석학 차원에서 잘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하나같이 색다르다. 즉 저마다의 빛깔을 갖춘 채 저마다의 생각 길을 걷고 있다. 읽을 맛이 깊이 우러난다. 최경옥(성균관대 일본학)은 개인이라는 낱말의 번역 과정을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고, 구연상(한국외대 철학)은 글쓰기의 본질이 사무침에 있다는 주장으로 많은 공감을 사고 있으며, 최봉영(항공대 한국학)은 아름다움의 뜻을 근본적으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아름과 다움의 세계를 새롭게 건립하고 있고, 이하배(항공대 철학)는 과거 유산으로 전락해 버린 예(禮) 사상을 통해 삶과 현실, 동양과 서양이 분리된 오늘날의 세계를 한데 아우를 수 있는 독특한 방법론을 찾고 있다.
이 책의 세 번째 부분은 원전 찾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우리에게 고전(古典)이 될 만한 원전을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말로 새롭게 풀어내며, 그로써 우리말로 학문하기를 펼쳐가는 것이 우학모가 할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하늘을 다스린 미리들의 노래(용비어천가), 즈믄 가람을 비춘 달의 노래-월인천강지곡(김정수, 한양대), 석보상절(김 두루한, 상명대)을 우리말글로 풀이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는 값지다. 그리고 우리 시가에 담긴 세계관과 그 말의 본바탕을 밝혀 깨우치는 윤덕진(연세대, 국문학) 교수의 글은 우리 노래의 고전을 맛보게 해 주고, 반대로 오규원의 시를 분석한 박경혜(연세대, 국문학) 교수는 우리말 의태어와 의성어가 그 나름의 독특한 의미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업적 평가를 위해 독백적으로 쓴 글들이 아니라 우리말로 학문하기의 운동을 위한 뜻으로 쓰고 모은 귀한 글들이다. 그래서 글마다 힘이 있고, 뜻하는 방향이 있고, 외침과 설득이 있으며, 읽는 맛과 멋을 마음껏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말이 우리의 문화를 얼마나 드높여 주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 준다. 그래서 책 제목에 고마움이라는 말이 붙었다. 이 책 머리말에서 미루어 보면, 고마움의 대상은 우리말글을 갈고 닦아온 모든 분들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말글을 이어갈 다음 분들임을 알 수 있다. 고마움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고 넓고 높은 마음, 즉 우리를 가장 크게 하나 되게 해 주는 마음이니, 우리 모두 이 책을 통해 우리말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
이명박 정부가 정권 인수 위원회를 통해서 주창하는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은 564년 전 중국 문물에 중독된 탓으로 역사의 반동자가 되어 버린 최만리 등의 주장과 상통하는 점이 아주 많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중국이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왜정 때 일본이 영구히 발전하고 팽창할 줄만 알았다고 변명하던 친일파 위인들의 현실주의적인 선택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14페이지
우리는 다음 셋에 마음을 써야 한다. 하나는 한자로 쓰인 우리의 고전 고문서 서책 등을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학술적 유산이요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광맥에서 학술적 문화적 보석들을 캐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자로 된 그 자료들을 한글로 옮길 때는 한자를 한글로 문자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뜻에 따라 옮겨야 할 것이나, 한글화의 욕심에 가려 비행기를 날틀로, 대학교를 큰 글방으로 옮기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둘은 외국서적을 옮길 때도 물론 글자를 글자로 직역해서는 안 될 것이요, 일본 번역이나 중국 번역에 맴돌아서도 안 될 것이다. 그 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여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의 말로, 사고로, 느낌으로, 논리로 풀어 옮기는 창작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번역이 제2의 창작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해야 할 것이다.
그 셋은 우리말로 학문하기가 언어적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학문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남의 이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이론을, 학설을, 사상을 세워 펴나가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말로 학문하기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학문을 세계에 내놓는 일에 맞닿아야 할 것이다. ―58페이지
![]()
지은이 우리말로 학문하기의 모임
정현기 세종대학교 초빙교수, 우학모 회장(국문학)
박영식 전 교육부장관, 학술원 부회장(철학)
최봉영 한국항공대 교수(한국학)
임재해 안동대학교 교수(민속학)
양권석 성공회대학교 총장(성서해석학)
최경옥 성균관대학교 비전임 교수(일본학)
구연상 한국외국어대학교 비전임 교수(철학)
이하배 항공대학교 비전임 교수(철학)
김정수 한양대학교 교수(국어학)
김두루한 상명대학교 강사(국어학)
윤덕진 연세대학교 교수(국어학)
박경혜 연세대학교 비전임 교수(국문학)
![]()
우리말로 배워 글 쓰는 일의 어려움과 즐거움
01 첫째 벼리 외침
새 정부의 언어 정책을 꾸짖는 외침
모두 잠깨어 일어날 때, 눈을 반짝 뜨고 바라볼 때
왕명에 의해 만들어진 훈민정음이 공용문서로 쓰이지 못한 이유
직업, 학문, 문학, 교육
우리말로 학문하기
우리말로 철학하기의 밑그림
우리말로 문화 읽기가 필요한 몇 가지 이유
영국 종교개혁에서 토착어(영어)의 역할
메이지기 individual이 個人으로 번역되기까지
02 둘째 벼리 불림
글쓰기와 사무침
한국인에게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예 철학하기의 방법에 대한 한 애벌그림 그리기
03 셋째 벼리 원전찾기
세종 때 두 노래가 우리말글 살이에 끼친 은덕
석보상절로 본 우리말 줄글 표현
노래의 샘, 말의 길
오규원의 날이미지시와 상징어의 기능